잡담 018 :: 엄마의 시간

어린 시절, 엄마는 늘 바빴다. 아침 일찍 나를 학교에 태워다 주고 출근하고나면, 밤 8시, 9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오는 날도 많았다.
어린 시절 아이들은 늘 그렇듯, 나 역시 갖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이 늘 넘쳐나던 아이었는데 항상 불만이라면 엄마가 싫어할 것 같은 갖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진득하게 엄마에게 할 시간이 모자라다는 것이었다. 엄마가 좀 한가하게 앉아 있는 때가 있어야 슬금슬금 다가가, 엄마, 나 내일 친구랑 새로 생긴 롯데리아 가게 5천원만. 혹은, 엄마 친구 정현이랑 애들 몇명이 정현이네 시골집에 놀러간다는데 나도 따라가면 안돼? 하루 자고 와야 하는데. 정현이 엄마도 같이 갈거야. 하는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저녁 늦게야 집에 들어오는 엄마는 늘 지쳐보였고, 집에 와서도 밀린 집안 일을 하느라 늘 바빴다.
엄마에게 긴히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날 저녁에는 엄마가 혹여나 일찍 들어오지는 않을까 기다려보다가, 역시나 안되겠다 싶으면 밤새 두근두근 가슴 졸이며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 엄마를 졸라대곤 했다.
내가 일어날 즈음에 엄마는 내가 일찍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일어나는 것보다 한시간은 더 일찍 일어나서 이미 샤워를 마치고 식탁에 앉아 빵조각 몇개를 뜯으며 커피 한잔을 마시고 있었다. 분명히 맥심 커피믹스를 사면서 받았을, 맥심이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히 새겨진 하얀색 머그컵에, 맥심 커피믹스를 홀짝이며 엄마는 식탁 위의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았다. 엄마 눈치를 살살 보며 다가가는 내 모습을 보기만 해도, 엄마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단번에 알았겠지.
-왜?
무뚝뚝한 엄마의 물음에 나는 초조해 하며 말을 잇는다. 엄마 있잖아..... 뭐라뭐라 어찌어찌 하면 안돼?
-.......안돼.
물론 단번에 된다고 할 때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초조했던 이유가 내가 생각하기에도 엄마가 안된다고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 역시나 안된다는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훨씬 많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왜 엄마, 누구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고 다들 한다고 하는데 왜애. 라며 졸라 보아도,
-안된다고 했다. 그만 얘기하자.
이렇게까지 되고 나면, 정말 엄마는 대화를 뚝, 끊고는 내가 아무리 뭐라고 더 졸라대도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엄마는 대꾸도 없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계속 묵묵히 그 커피를 마셨는데, 나는 우리집 그 길쭉한 식탁에서 한쪽 다리를 의자에 올린채로 앉아 신문을 보며 커피를 한모금씩 마시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히 그려진다.
지금까지는 엄마에 대한 아주 원망스러웠던 기억.
그런데 나 역시 엄마가 되고 난 지금 불현듯 다시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다.
내가 혹시, 하루 중 유일한 엄마만의 시간, 길어야 기껏 30분 정도였을 그 소중한 시간을 방해했던 것이 아닐까. 내가 좀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엄마의 언성이 높아지던 날도 있었는데, 아침부터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나서 엄마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리 없었을테지. 나는 엄마의 시간과 엄마의 하루마저 망쳐버렸던 걸지도 모른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아기의 수면 패턴을 잡아주는 것이 이렇게나 힘든 일인 줄 미처 몰랐다. 신생아 시절에는 깊은 수면에 빠지기 때문에 한번 잠들면 좀처럼 깨지 않고 길게 자는데, 아기가 4개월이 넘어가면서 찾아온 sleep regression 때문에 내 생활도 완전히 엉망이 되어 버렸다. 두달여의 말 그대로 전쟁같은 나날 끝에 이제 점점 밤 수면과 낮 수면의 패턴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물론 이것도 이가 나기 시작하면은 또 다시 엉망이 되어버린다고 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는 하루 중 몇번의 아기의 낮잠 시간 중, 가장 길게 자는 시간 동안을 내 시간으로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못하던 블로그도 하고 놀고, 책도 읽고, 일기도 쓰고.... 가끔 정말로 힘들었던 날엔 가만히 멍 때리고 있기도 한다.
그런데 가끔씩 아기가 예상보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깨어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다 하지 못했을 때, 나도 모르게 짜증이 밀려오는 거다. 그러면 안되는데도, 일찍 잠에서 깬 아이와 놀아주는 마음이 그렇지 않은 날에 비해 즐겁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 그것 때문에 더 더 기분이 안좋아 질 때도 많다.
의지가 없는 아기에 의해 내 시간이 방해 받을 때에도 이렇게 기분이 안좋아지곤 하는데, 그 시절 엄마는 어땠을까. 내가 몹시 미워지는 때도 분명 있지 않았을까?
어린 시절, 엄마는 그냥 엄마였다. 날 돌봐주고, 날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듯 여겨졌고, 엄마의 감정이나 취향, 엄마의 정신적, 혹은 육체적 웰빙은 나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와서, 이렇게나 뒤늦게, 그때 엄마는 어땠을까, 나는 왜 엄마에게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번씩 불쑬불쑥 떠오르곤 하는 것이다.
딸은 시집을 가면 철이 든다고 하더니, 나는 그것보다 늦게 내 딸을 낳아보고 나서야 조금씩 철이 들고 있는건지.
너무 멀어 우리 엄마 얼굴을 보고 대화를 했던 때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하지만, 조만간 다시 한국에 가서 엄마와 진득하게 대화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 대화의 깊이는 예전과는 사뭇 다를 것만 같다. 그때가 되면, 내가 갓난아기 때 부터,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수없이 망쳐버렸을 엄마의 소중한 시간에 대해서 꼭, 사과해야지. 그리고 나서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밥을 먹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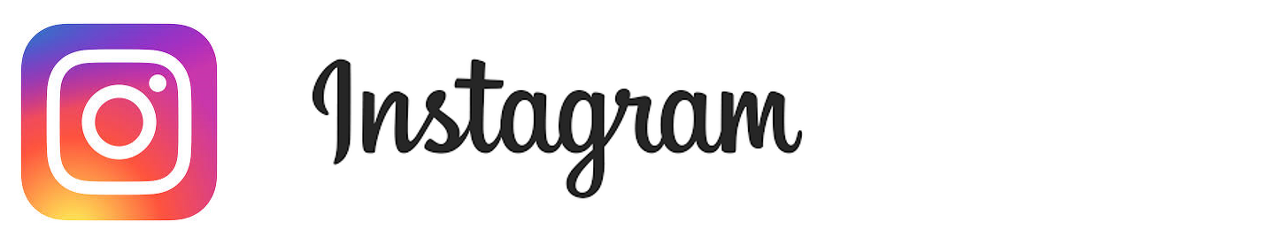

글에 남긴 여러분의 의견은 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