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노트] 과학적 상상력으로 창조된 세계에서의 말랑말랑한 로맨스, 장강명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

역시 리디셀렉트에서 광고를 보고 선택한 소설, 장강명이라는 작가의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을 읽었다. 장강명 작가의 대표작으로는 <표백>이라는 소설이 있다고 하는데 제목만 여러번 봤던 기억이 났다.
책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01_정시에 복용하십시오
02_알래스카의 아이히만
03_지극히 사적인 초능력
04_당신은 뜨거운 별에
05_센서스 코무니스
06_아스타틴
07_여신을 사랑한다는 것
08_알골
09_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10_데이터 시대의 사랑
첫번째 단편인 정시에 복용하십시오는 굉장히 짧은 글이었는데 사랑을 시작한 연인이 약을 먹으면 그 사랑이 식지 않고 (약을 먹는 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설정이 굉장히 참신하다고 느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을 이어가던 중,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나의 진짜 사랑인 것 같아 약을 먹는 것을 중단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어지는 단편들, 알래스카의 아이히만이나 당신은 뜨거운 별에, 센서스 코무니스, 데이터 시대의 사랑에서는 이렇듯 아주 기발하지만 어쩌면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발전된 과학기술 시대에서의 이야기들을 그렸다.
알래스카의 아이히만은 첫번째 글과는 비교되도록 꽤나 긴 단편이었는데 결말이 궁금해서 참을 수 없다 싶을만큼 재미있게 읽었다. 읽으면서 내내 이런 글의 결말을 대체 어떻게 지으려는 거지? 의문이 들었는데 결말을 읽으면서는, 그래 역시 이런 정도의 결말이 아니면 안되었겠지, 수긍하게 되었달까.
단편집의 제목이 된 역시나 아주 짧은 단편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은 예상보다 훨씬 귀여운 단편이었다. 읽으면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스타틴, 여신을 사랑한다는 것, 알골,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같은 작품은 말 그대로 SF 장르의 소설들인데 내가 SF 소설들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는데도 아주 재밌게 읽었다. 특히 그중 길이가 가장 길었던 아스타틴의 경우 처음에는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읽다보니 흠뻑 빠져들어버렸다. 아마 그 이유는, 이렇듯 과학적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비현실적인 창조된 세계에서 그리는 사랑 이야기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모든 단편이 그러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결국엔 인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각 작품 초반에 창조된 세계의 특징들을 따라가며 딱딱하게 굳은 뇌가 어느 순간 말랑해져 있음을 느꼈다고나 할까.
거의 모든 작품들이, 어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싶을 만큼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하지만 그런 상상력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엔 역시 가장 인간적인 감성들을 건들여서 아주 독특한 느낌의 작품들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소설 장르를 그냥 SF라고 해도 되는걸까, 싶을 만큼 읽고 난 후 독특한 감상이 느껴지는 책이었다.
언제나처럼, 원하는 책은 사서 읽고, 그냥 관심가는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 읽던 나였더라면 절대 읽지 않았을 책 같은데, 우연히 읽기 시작했지만 너무 재미있게 잘 읽어서 역시 리디셀렉트 구독하길 잘했어, 라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 밑줄 긋기
#00
“그런 질문은 보다 전에 해야 했던 거 아닙니까? 나치가 유대인들을 격리하고 가스실로 보낼 때요. 왜 당신들은 그때는 나치에게 무슨 권리와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에 와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려 할 때 권리와 자격을 따지는 겁니까?”
#01
“그건 정의인가요, 아니면 복수인가요? 아이히만이 자기가 피해자들에게 준 고통을 모르는 채로 죽는다면, 그런 처벌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충분히 달콤하지 않은 건가요?”
#02
물론 우리는 그런 헛소문을 믿지 않았지만 적어도 연구소가 최첨단 장비로 그득할 거라고는 기대했다. 정작 연구소는 내가 다녔던 대학의 공대 건물과 비슷했다. 멋대가리 없게 실용적으로 지은, 늘 한구석이 공사 중이고 며칠 밤을 새운 듯한 표정의 대학원생들이 흰 가운을 입고 돌아다니던.
#03
나는 8년 전 공개재판이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큰 충격을 줬는지 새삼 이해할 수 있었다. 아이히만은 학살이라는 거대한 범죄를 저지르기에는 너무 시시하고 하찮아 보였다. 유대인이 아닌 내게 그는 가증스럽다거나 분노를 일으킨다기보다는 그저 더럽고 불쾌했으며, 교수대나 전기의자에 보내기보다는 밟아서 터뜨리거나 살충제로 제거해야 할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저 악마 같은 인간이 한때 유대인에게 품었을 태도였다.
#04
‘종종 타인은 지옥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그 지옥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있음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05
말해놓고 나니 거짓말이었다. CCTV를 보고 있으면 그 화면 속 인물의 부재감(不在感)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된다. 그런 감각은 삶에 영향을 미친다.
#06
“인간은 싸고, 무게도 70킬로그램밖에 나가지 않는 비선형(non-linear) 다목적 컴퓨터 시스템이다. 그것도 비숙련 노동자가 대량생산할 수 있는.”
#07
다른 사람이 답안을 알려준 정답과 자신이 선택한 오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후자다. 사람은 오답을 선택하면서 그 자신이라는 한 인간을 쌓아가는 것이다.
#08
‘여론에 따라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여론에 따라서 선악을 가늠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나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09
새벽의 여신 에오스를 로마에서는 ‘아우로라’라고 불렀다. 오로라의 어원이었다. 그녀는 사랑할 때마다 끝이 불행해지고야 마는 저주를 받았다. 뜻대로 되지 않는 여인에 화가 치밀 대로 치민 아스타틴은 잔인한 장난을 쳤던 것 아닐까? 아스타틴은 자신의 실패작이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이 거대한 형상으로 우주에 펼쳐지도록 했다. 멀리서도 누군가가 그걸 감상할 수 있도록. 비록 아스타틴 본인은 에오스를 기억하지도 못했지만 말이다.
#10
우주선이 잔인할 정도로 매끄럽게 날아올랐다. 나는 동상처럼 꼼짝 않고 서서 하늘의 점이 되어가는 우주선을 올려다보았다. 우주선에 타기 직전에 본 그녀의 눈에 대해 생각했다. 나의 일부가 영원히 이 순간에 사로잡혀 있을 것을 예감했다.
#11
이유진은 인간 삶의 기본 조건에 불확실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음식, 의복, 주택, 안전만큼 중대한 문제는 아닐지 몰라도 애정이나 존경, 소속감보다 후순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불확실성은 그런 조건의 조건일지도 모른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미래가 어떨지 몰라야 사랑하고 모험하고 발견하고 결단할 수 있다.
#12
이유진은 얼굴을 들고 눈을 감은 채 송유진에게 다가갔다. 다가온 얼굴에서 다정한 불확실성의 향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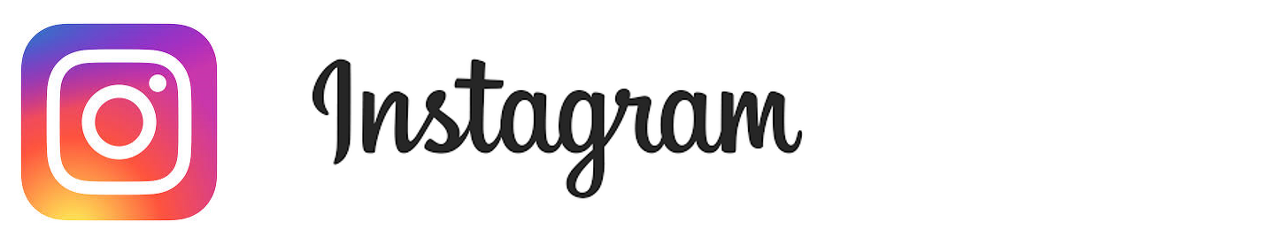

글에 남긴 여러분의 의견은 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