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노트] 이토록 불친절한 단편들, 이기호 <김박사는 누구인가?>

이기호의 책은 처음이었다. 한국 소설은 한국에서도 아주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었는데 한국을 떠나고 나서는 도저히 접할 길이 없어 아주 옛날 작가가 아니고서는 인기있다는 한국 작가들은 모두 다 생소한 이름들인 것 같다.
대표작도 여럿 있는 듯 했지만 나는 역시 리디셀렉트로, 이기호의 단편집 <김박사는 누구인가?>를 읽어보았다.
행정동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
김 박사는 누구인가?
저기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간다
탄원의 문장
이정(而丁)-저기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간다 2
화라지송침
내겐 너무 윤리적인 팬티 한 장
실린 단편의 제목들이다. 사실 첫번째 작품, 행정동은 그냥 그랬다. 담담하게 여운을 주는 단편들은 좋아하는 편인데, 이건 이도저도 아닌 느낌. 그냥 덮어버리려다가, 하나만 더 읽어보자는 생각으로 넘긴 다음 작품,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이 생각보다 맘에 들었기에 마지막까지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단편집의 제목으로 선정되기도 한 세번째 작품, 김박사는 누구인가? 에서는 또 실망감이 들었다. 김박사로 대변되는 상담자의 일반론적인 상담이 한 개인과 그 가정을 서서히 파괴시키는 이야기. 마지막엔 그래서 김박사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독자 스스로 던지도록하는 장치가 있는데, 보는 순간 뭔가 굉장히 화가 났다. 책을 읽으면서 독자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참 좋지만, 그것은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여백, 호흡 한번에 달라지는 느낌 같은 뭐 그런 미묘한 것이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대놓고 지면을 비워놓고 답을 채우라는 식이니... 새로운 시도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냥 내 스타일은 아니었달까.
하지만, 저기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간다,에서의 안타까운 상황과 그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주인공의 심리묘사는 무척이나 맘에 들었고 탄원의 문장, 이정(而丁)-저기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간다 2 역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 하며 재미나게 읽었다.
특히, 한 대학가에서 선배들이 강압적으로 먹인 술로 한 여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을 그린 이야기 탄원의 문장에서 몇몇 인물이 이름 대신 이니셜로 표기된 것이나 그렇게 만들어진 익명성이 나중에 지시관형사 하나로 뒤틀려 버리는 것 같은 작품 속 세세한 장치들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화라지송침. 아주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 것, 작품에서는 두루마리 휴지에 공포를 느낀다는 것을 이토록 절묘하게 아주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과거와 연결시킬 수 있다니.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방식이 너무 능숙해서 책을 읽던 나는 문득 참을 수 없이 무서워져 등을 침대에 꼭 붙이기도 했고, 너무 슬프고 안타깝기도 해서 며칠이 지나도록 내내 이 작품이 머리속을 떠나질 않았다.
8개의 단편이 모두 마음에 쏙 든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에 드는 것은 정말 아주 마음에 들었다. 무게감이 아주 대단하다.
결국은 죄의식에 관한 이야기인 걸까.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것만 같은 이야기. 그리고 그 상황이나 심리에 대한 묘사가 너무 현실감이 있어서 상황들을 소설 속의 것만으로 떼어두고 생각하기가 힘이 들었다. 그리 특별히 나쁘거나, 그리 특별히 모자라거나, 그리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불행, 그 참을 수 없는 재수 없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중간중간, 방금 이 문장, 무슨 말이 하고 싶은거지? 싶어 다시 읽어보면, 으응- 싶은 부분들이 있는 것도 좋았다.
조금 찾아보았는데 이기호라는 작가가 이런 풍의 소설을 주로 쓰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짧은 단편으로도 이렇게 깊은 여운을 남기는 작가라니, 이 작가의 다른 작품도 꼭 찾아보고 싶어졌다.
+ 밑줄 긋기
#00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불편도 없는 상태에서 느끼는 불행이란, 곧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도 아마 그즈음의 일이었을 것이다.
#01
그건 또한, 당연히 고모의 잘못도 아니었다. 고모는 그때 스물세 살이었다. 자취방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면, 돌아가지 않는 게 당연한 스물세 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모든 걸 쉴 새 없이 이야기하고픈 스물세 살, 하루하루만 의미 있는 스물세 살, 그 스물세 살 말이다.
#02
사람들은 저마다 이야기 속에 한 가지씩 여백을 두고, 그 여백을 채우려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법인데, 그게 이 세상 모든 이야기들이 태어나는 자리인데, 그때의 나는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03
그는 일부러 얼굴 주름을 더 많이 만들어 웃었지만, 마음은 씁쓸했다. 그건 그에게 잡히지도 않고, 헤아릴 수도 없는 시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04
밤에 만나는 아이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에겐 모두 서글프게 다가왔다. 그는 그것을 잊고 있었다.
#05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예상 때문에 그 예상과는 다른 일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때가 종종 있다. 그것이 소설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면, 차근차근 플롯을 뒤집어보면서 빗나간 예상들을 이해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거릴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서의 우리는 언제나 허둥거리다가 자신이 무엇 때문에 놀랐는지도 모른 채 또 다른 예상 속으로 빠져버리기 일쑤다.
#06
─제가 한 학기밖에 안 다녀서 잘은 모르지만…… 행정이라는 게 항상 법 뒤에 오는 거래요. 거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구요.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행정의 운명이라구요. 한데 문학은 안 그렇잖아요? 진짜 문학은 항상 법 앞에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선생님?
#07
우리가 알고 있는 입증 불가능한 것들은, 어쩌면 입증 가능한 사실들로부터 나오는 것들인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그것은 ‘발견’의 영역이지, ‘발명’의 영역은 아닌 것이다. 사실들과 사실들 틈 사이에서 불가능한 것들은 시작되고 피어난다는 것, 그래서 숙명적으로 사실들의 세계에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 거기에서부터 최의 탄원서는 시작되었다.
#08
나는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짐작과 진실 사이엔 그리 큰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짐작이란, 어쩌면 진실을 마주 보기 두려워서, 그게 무서워서 바라보는 그림자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또한 갖게 되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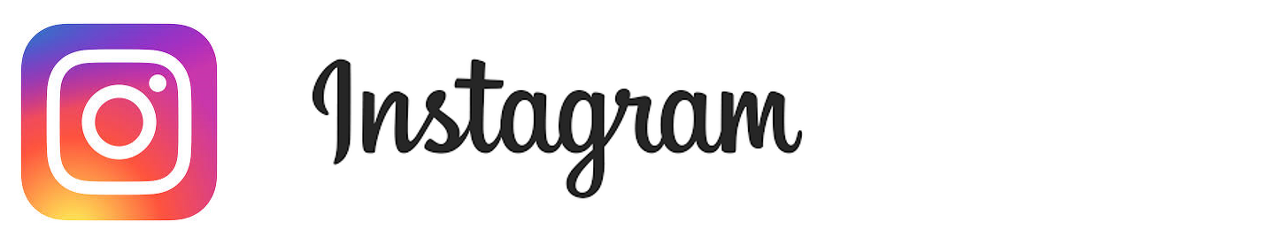

글에 남긴 여러분의 의견은 개 입니다.